1억1,400만대와 1,900만대, 2,000만대와 145만대. 인구 13억4,700만명이 1억1,400만대를 보유한 중국, 그리고 5,000만명이 1,900만대를 운행 중인 한국의 시장 규모 차이다. 연간 신차 판매량은 중국이 2,000만대, 한국이 145만대로 중국이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시장이 포화도 아니다. 한국은 2.6명당 1대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12명이 한 대를 나눠쓰는 형국이다. 우리처럼 2.6명당 1대를 가지려면 보유 규모만 5억1,800만대가 돼야 하고, 그러자면 향후 4억400만대가 늘어나야 한다. 매년 2,000만대가 20년 넘게 판매돼야 달성 가능한 숫자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전략 지역을 구분할 때 '중국'을 별도로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의 지역별 세계 시장 분류법은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이 중국과 기타 지역으로 나뉜다. 단적으로 현대기아차도 중국사업 조직은 별개로 움직인다. 중국이 자동차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성장과 생존을 위한 역량 집중은 필수 요소다.
이런 이유로 근래에는 중국에 진출한 합작사가 독자 모델을 만드는 일도 빈번하다. 합작사 브랜드로 출시되는 만큼 기술은 해외사가, 생산과 판매 및 유통은 중국사가 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서 해외 파트너를 중국 회사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년 전 상하이자동차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상하이차는 당당하게 상하이GM 공장을 자신들의 것이라며 소개했다. 그리고 2년 후 GM은 아시아사업 전략발표를 위해 같은 상하이GM 공장을 자랑했다. 상하이차나 GM에게 합작공장은 서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것일 뿐 소유는 정확히 반반이다. 베이징현대도 마찬가지다. 현대차가 소개를 하면 한국차의 중국 현지 진출 사례이고, 베이징차가 얘기할 때는 외형이 확대된 그들의 현지 공장일 뿐이다.
중국 개혁개방을 리드했던 덩샤오핑은 그 유명한 '흑묘백묘(黑描白描)'라는 말을 남겼다.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의미다. 자동차로 보면 미국 및 독일과 같은 서방이든, 아니면 토요타와 현대차 같은 아시아권이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해 자동차를 생산케 하면 된다는 말과 같다. 어차피 중국 안에 공장이 있으면 일자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어서다. 해외 파트너가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 토종 업체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합작을 하도록 한 배경이기도 하다.
요즘 한국이 자동차 생산을 두고 시끄럽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생산 감소를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생산 감소는 곧 수출 하락을 의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시장 규모가 145만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회사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해가면서 한국은 규모 면에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여전히 제품력과 브랜드가 우선이지만 기업 내에선 지역을 감안한 공장 간 경쟁이 이뤄지는 중이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우선이다.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또한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도 버려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회사가 성장일로에 있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는 기울어가는 중일 수도 있다. GM이 그렇게 쓰러졌고, 피아트그룹도 비슷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간 생산량 420만대 가운데 145만대만 국내에 남고 275만대가 해외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호시탐탐 한국 생산 물량을 해외 공장들이 노리기 때문이다. GM이 한국 공장의 생산성을 언급할 때, 르노그룹이 르노삼성의 부산공장을 얘기할 때마다 외치는 일자리 보전은 점차 미약해지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대기아차도 해외 생산을 늘려가는 중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합의와 화해를 할 때다. 힘을 합쳐 한국 내 생산물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다. 고집을 피우다 이미 아픔을 경험했던 기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다.
지금 상하이에선 중국차 자랑이 한창이다. 규모 면에서 최대에 버금간다. 자동차 블랙홀 시대로 접어든 만큼 바퀴 달려 굴러 가는 것은 뭐든지 있다. 그런 중국이 호시탐탐 미소를 지으며 한국 내 생산물량을 바라고 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원하는 수 억 명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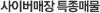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0/2000자